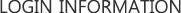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존재학”과 “노벨상 / 圓山 위정철
2017.07.14 14:13
“존재학”과 “노벨상”
나는 가끔 위문(魏門)에 대해 공상을 하곤 한다. 자화자찬하기도 하고, 비관한 나머지 침울하기도 한다. 그런 공상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명문론(名門論)」도 있다. 말하자면 “우리도 언젠가 명문이 될 수 있을까”를 떠올린다. 때론 저간의 상황으로 보아 가능성이 있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망상(妄想) 같기도 한다.
존재 선생의 말씀처럼 위씨는 한미한 성씨이다. 시조께서 신라에서 아찬의 품계를 받았다 하나 명문은 아니다. 고려 예종 때 지금의 국무총리 격인 문하시중을 역임한 충렬공(忠烈公) 한 분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벼슬아치도, 단결력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시골에서 천석군 두셋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위문 후손에게 긍지를 갖게 해준 조상이 계신다. 그가 곧 존재 선생이다. 선생은 생전에 작은 고을 현감을 역임한 게 벼슬의 전부였다. 그러나 선생이 남긴 1백여 권의 저서는 품계 높은 관작이나 억만금보다 빛난 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그 빛나는 유산을 진흙에 묻혀두고 외면하거나 아예 백안시하고 있다.
선생의 이름이 이 정도로 알려진 것은 순전히 학자들에 의한 노력의 결정이다. 1960년부터 국내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지금까지 60여 년간 「존재학」으로 학위를 받은 학자는 박사 6명, 석사 10명에 관련 논문은 대략 100여편에 이른다. 이들의 연구가 없었다면 선생의 학문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후손들은 무엇을 했는가. 부끄럽게도 선생의 학문을 진작 시키는데 이바지하지 못했다. 그 흔한 「존재학회」의 설립을 의결기구에서 4번이나 의결하고도 없었던 일로 치부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뒤인 2016년 11월에 겨우 임의단체인 「존재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지난 5월 15일 제 1회 ‘존재의 날 기념식’을 가진 것으로 위안해야 했다.
「존재학」과 관련해 비유해볼 게 하나있다. 한국국민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열망이다. 미국의 시사교양지 '뉴요커'가 2015년 12월 28일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을 다룬 칼럼을 온라인판에 실었다. 저명한 문학평론가 마이틸리 라오가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이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칼럼이 그것이다.
칼럼은 한국인들의 노벨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조소하듯 비꼬았다. 즉, 정부가 문학의 세계화정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문학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면서 수상만을 바라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식자율은 무려 98%에 이르고, 연간 4만권의 책이 출간되나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전무하다고 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한 통계도 곁들었다. 2005년 영국 조사기관에서 국민 한 명이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을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은 꼴찌를 차지했다. 반면 언제나 상위권을 차지하는 일본과 대비된다. 해마다 유력한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고은 시인에 대한 소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위문의 후손들도 역시 한국국민이다. 노력 없이 노벨상 받기를 희원하는 것이나 위씨의 후손들이 ‘존재학’의 발전을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 요즘 졸탁동기(啐啄同機)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알 속의 새끼와 어미가 서로 껍질을 쪼아야 한다는 뜻이라 한다. 존재학 발전을 위해 음미해볼만하다.
2017. 6. 17 圓山
이 글은 위씨소식誌 제27호(2017.07.01)에서 발췌했습니다.